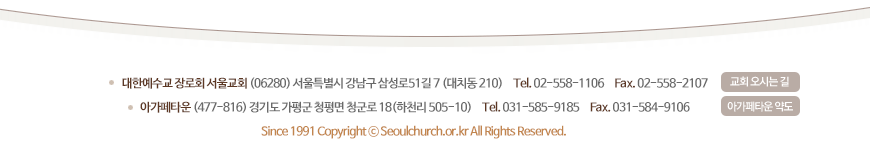한국의 사회복지사업에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지역사회 곳곳에 복지기관을 설치하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제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던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내한 선교사들의 사회복지사업은 1920년대에 들어서 활발해졌다. 선교 초기에는 교육과 의료, 전도에 전념하느라 사회복지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1921년 미국 감리회 여성들의 후원에 힘입어 태화여자관으로 출발한 것이 한국 기독교의 사회복지, 나아가 한국 사회복지 역사의 시작이다. 당시 사회문제는 다양했지만 역시 억압되어 있는 여성들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한국의 기독교 사회복지가 여성복지로 시작하였다.
김활란은 1934년 감리회 한국선교 50주년 기념식에서 감리회가 한국 여성에 끼친 영향으로 첫째, 말씀, 둘째, 가정생활의 변화, 셋째, 여성병원?유아복지?공중보건 사업, 넷째, 여성 교육을 뽑았다. 김활란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복지는 사실 유아복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복지는 곧 모자복지(母子福祉)와 유아복지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의 유아복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1926년 8월 24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1921년부터 1925년 사이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49.6%였다. 둘 중 하나가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는 끔찍한 수치이다. 아동 사망 원인은 소화기 계통의 병, 호흡기 병, 신경계 병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양 결핍에 있었다. 선교사들은 이 영양결핍과 그로 인한 유아 사망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했다.
1923년 미감리회 해외여선교회 파송으로 내한한 마렌 보딩(Maren Bording)은 공주 지역 의료선교사인 파운드(Norman Found)의 조수 역할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보딩은 파운드와 왕진을 다니다가 아기들이 열악한 건강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1924년 특별한 지원조직도 없이 개인적으로 유아복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작은 병원 한 켠에서 유아진료를 보는 것이었다. 그러다 아이를 위해 뭐라도 더 배우고 싶었던 어머니를 모아 ‘자모회’를 만들고 위생과 육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의 사망률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영양부족으로 인한 질병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보딩은 한국에서 우유가 음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하루 1-2병의 우유를 먹일 수만 있다면 아기들을 질병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우유급식을 위해서는 우유병과 젖꼭지의 소독 시설을 갖춘 건물이 필요했다. 그는 이 공간을 위해 병원의 간호사, 성경부인과 함께 특별기도회를 갖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미감리회 여선교사회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의 어느 노신사가 기부를 약속했다는 소식이었다. 보딩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기뻐했다.
1926년 6월 공주에 한국 최초의 우유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보딩의 판단은 정확했다. 1927년 보딩은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자신의 유아복지와 우유급식사업 대상인 아이들의 사망률을 5%라고 보고하였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 유아사망률 50%와 비교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었다. 효과가 확인되자 1928년 서울과 평양에서도 선교사들에 의해 우유급식이 시작되었다. 평양의 어떤 어머니는 이미 아이 둘을 잃고 세 번째 아이마저 잃을 수 없다는 일념에 하루에 세 번씩 우유를 타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다. 우유를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한국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우유급식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는 젖소가 몇 마리 없어 우유를 전부 수입해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유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아기 한 명을 입양 결연하여 우유급식 비용을 대주었다. 한국인 고위관리나 지방 경찰서도 후원에 동참했다. 역시 아이들을 살리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다.
선교사들은 부족한 우유 대신 염소의 젖을 이용하거나 두유를 만드는 식으로 우유급식사업의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더 많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려면 비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10년 뒤인 1938년 태화복지관의 로젠버거(E. T. Rosenberger) 선교사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액체와 분말 두유를 도입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기위해 노력했다’면서 “현재 분말 두유는 한국 전 지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선교사들의 노력이 한국 아동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우유급식사업이 단지 유아의 사망률만 낮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멘트(Charles C. Amendt) 선교사는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냉랭한 채로 두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우유급식사업이 복음전도에 끼칠 긍정적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우유급식사업은 아이의 건강과 부모의 영혼을 모두 구했다. 사랑이라는 게 늘 그렇다.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더 큰 열매를 맺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