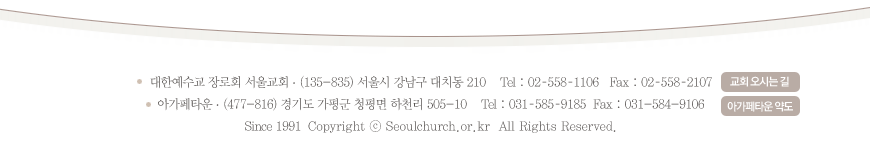1911년 총 2,174쪽에 94만여 자를 수록한 성경전서가 출판. 풍부한 어휘와 활자로 한글이 사용된 전례가 없었다. 한글도 수준 높은 사상을 전달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 최현배가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된 것"이라...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파송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참고할 만한 책이 없었다. 가톨릭 선교사가 만든 한국어-프랑스어 사전인 「한불자전」과 만주의 로스 선교사가 출판한 「한국어 첫걸음」Corean Primer) 정도가 있을 뿐이었 다. 결국 내한 선교사들은 스스로 한글을 공부하기 위한 책을 만들었다.
언더우드가 한불자전」을 참고해가며 「한영문법」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한영자전」 「영한자전」을 간행했 고, 게일(James S. Gale)은 1893년 「사과지남」Korean Grammatical Forms)과 1897년 「한영대자전」을 발간했다.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도 한국어 교과서인 「한글입문서」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를 발간했다. 물론 이런 작업은 선교사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채용한 조선인 어학선생의 도움이 매우 중요했다.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한글은 자연스럽게 선교언어 로 자리잡게 되었다. 1893년 1월 미북장로회 선교부는 선교 방침으로 '모든 문서는 한문을 섞지 않고 순전히 한글로 인쇄한다'를 채택했다. 미북감리회 선교부도 1888년 배재학당에 한글로 인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활판 인쇄소인 삼문출판사를 차리고 성서와 찬송가는 물론 「천로역정」과 같은 각종 기독교 문서를 순한글로 출판하였다. 또한 독립협회 기관지 「독립신문」1896년 창간), 미북감리회 기관지 「조선그 리스도인회보」1897년), 미북장로회 기관지 「그리스도신문」1897년) 등의 여러 순한글 신문을 인쇄하였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은 짧은 기간에 전 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잘 간파하였던 것이다.
반면 한글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 400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언어로 사용되면서 서서히 나라글(國文)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글은 창제 이후에도 한문을 숭상하는 사대부 계층의 억압을 받으며 오랫동안 무시당해 왔다. 조선시대 내내 공공언어는 한문이었으며 한글은 비공식적인 보조언어에 머물러 있었다. 수준 높은 사상적 체계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 아녀자 또는 아이들이나 쓰는 글로 취 급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이자 사상체계인 기독교가 한글을 통해 선교에 나서자 비로소 우리 사회에 한글이 공공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11년 총 2,174쪽에 94만여 자를 수록한 「성경전서」가 출판 되었는데 이처럼 풍부한 어휘와 활자로 한글이 사용된 전례가 없었다. 한글도 수준 높은 사상을 전달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한글학자 최현배가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된 것"이라 한 것이나, 전택부가 "한글성서는 한국 국어사에 있어 가장 커다란 사건"이라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이다.
배재학당 삼문출판사는 한글연구에 중요한 인물을 배출하였다. 주 시경이다. 주시경은 배재학당 학생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다가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이후 평생을 한글 연구와 보급에 바친 사람이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은 일제 말의 민족 문화말살정책에 맞서 한글을 수호하기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이윤재(안동교회 장로), 최현배(새문안교회 집사), 김윤 경(정동교회 교인)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교회 역시 1940년대에 일본어로 설교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한글성서와 찬송가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렸다. 최현배는 "우리 말, 우리 글 수호의 공 을 기독교에 인정하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독교는 잠자던 한글을 깨워 우리 민족의 언어로 자리잡게 하였 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 한글을 지켰다. 지금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우리 말과 글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는 신앙선배들의 공과 희생이 크다.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